
지난 주말 김장을 하기 위해 시골을 다녀왔다.
객지로 나가 있는 동생들,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연례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한 해동안 해야 할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다. 김장을 위해 시골에 계신 어머님를 중심으로 큰 행사를 치르듯, 날자를 잡고, 밭에 있는 배추와 무를 뽑고, 김장에 쓸 고춧가루며, 마늘, 파, 액젓 등을 준비하고, 김장말 먹을 보쌈용 돼지고기까지 준비하며 D데이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김치 담그는 행사가 어찌 우리 집안 만의 일이겠는가?.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것을 심심잖게 발견할 수 있다. 김장 하셨나요? 하는 인사가 통용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설, 추석 같은 명절 버금가는 연례행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장, 곧 김치를 담그는 일이다. 겨우내 먹기 위하여 통배추김치·깍두기·동치미 등 등의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지칭한다. 이러한 김치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다. 한국의 자존심, 상징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로부터 국제 규격식품으로 공인받았고, 2006년에는 미국의 건강잡지인

잘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엔의 산하 유네스크에서는 각 국간의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유네스코 유산을 등재한다. 한국에는 세계유산으로 석굴암·불국사(1995년 등재), 가야고분(2023년 등재) 등 16건, 세계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1997년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념물(2023년 등재) 등 18건이 있다.
그 중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이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등재년도 2001년),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택견(2011), 줄타기(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등 22건이다.
그 중에서 김장문화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한국들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며, 결속을 촉진하고 한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준다는 점과 비슷한 천연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인용) 이렇듯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무형유산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유산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치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자. 고려시대 중엽 문장가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장을 담근 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 되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채소를 절여, 즉 김장을 하여 겨울을 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채소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고려에서는 절인 채소에 양념을 더하는 김치로 발전하여 오이, 미나리, 갓, 부추 등 채소 양념이 곁들여지고, 파, 마늘이나, 생강, 귤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 양념 김치 여기에 더하여 물김치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은 김치로 발전한 것을 고추 도입과 해산물 젓갈류가 더해지는 조선시대 후기 임진왜란 이후이다. 감칠맛을 더해주는 해산물 젓갈류가 고추의 매운 맛과 향 때문에 해산물 특유의 비릿한 맛이 줄어들면서 김치는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적절히 혼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채소 발효음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김치는 각 지역별로, 또 집집마다 크고 작은 독특한 차별성을 지니며 각양각색의 맛을 지닌다. 지방마다 김치 맛이 다른 것은 기후에 따라 양념과 젓갈이 다르기 때문이다. 추운 북쪽 지방인 함경도·평안도 지역은 싱겁게 소금간을 하고 양념도 담백하게 하여 채소의 신선미를 살리는 반면에, 남쪽지방은 소금간을 세게 하고 빨갛고 진한 맛의 양념을 하며 국물을 적게 만든다. 젓갈 종류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함경도·평안도 등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은 새우젓·조기젓이 많고, 경상도·전라도 등 남부지방은 멸치젓이 많이 사용된다. 함경도지방에서는 명태 등의 생선을 넣고, 평안도는 쇠고기 국물, 전라도에서는 찹쌀풀이나 쌀을 넣기도 한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김치의 기본은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속을 넣는 통배추김치가 기본이지만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중 몇을 들어보면, 보쌈김치, 배추속대김치, 깍두기, 비늘깍두기, 동치미와 짠지, 고들빼기김치·파김치·갓김치, 섞박지 등 등이다. (두산백과 참조)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언론기사도 대거 쏟아진다. 사회 지도층, 유명인 누가 김장 봉사를 했다는 보도, 김장을 하여 불우한 이웃에 전달하였다는 보도 등이 심심잖게 보인다. 또 한 편에서는 직접 집에서 담가 먹는 대신 완제품인 김치를 사먹는 추세도 늘어, 최근 식품산업정보통계(FIS)에 따르면 2023년 1~9월 할인점, 슈퍼, 편의점,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팔린 김치 총판매액은 232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보도도 보인다. 주변에서도 김장대신 김치를 사먹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2023년 11월 현재도 김장문화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김장 문화도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는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며 문화로서, 세계인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과 인륭의 문화와 함께 지속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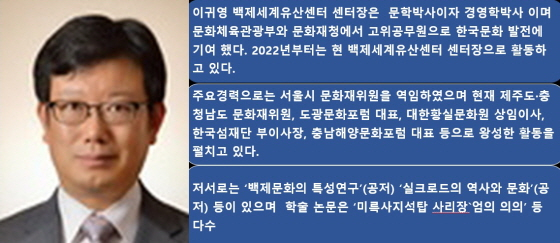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