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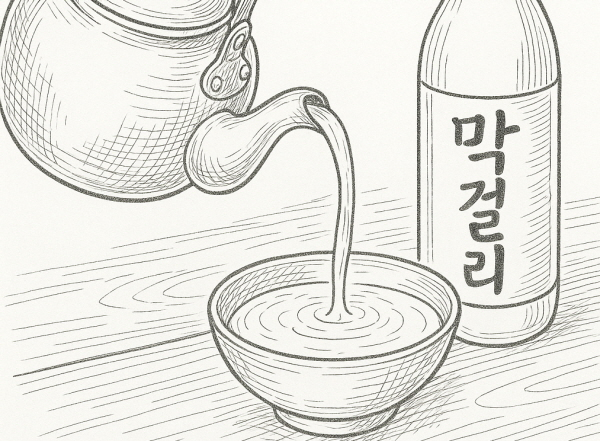
"흰 술 한 사발, 천년의 기억"
막걸리의 기원과 뿌리
하얗고 뿌연 막걸리 한 사발을 마주하면, 어쩐지 마음이 느슨해진다.
술은 천천히 잔을 따라 돌고, 마주 앉은 이의 표정도 그만큼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그저'막걸리'라 부르지만, 사실 이 술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온'살아 있는 역사'다.
막걸리의 기원을 정확히 단정하긴 어렵지만, 벼농사를 시작한 이래, 남은 쌀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등장한다. 고대 문헌 속에서는'농주(農酒)','미주(米酒)','탁주(濁酒)'라는 이름으로 언급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막걸리가 마을 잔치와 제사상, 그리고 평범한 농가의 일상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막걸리는 원래 가정에서 빚는 술이었다. 이를'가양주(家釀酒)'라 부른다. 쌀과 물, 그리고 누룩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 발효의 세계는 신비롭지만, 그 기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막걸리의 기본 제조 방식은 곡물 속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당화, 그리고 그 당을 술로 바꾸는 발효 두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어떻게,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 막걸리는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로 나뉜다.
단양주는 쌀과 누룩을 한 번에 넣어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하고 빠르다. 요즘 대량생산되는 공장형 막걸리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이양주는 먼저 만든 술밑에 다시 쌀과 누룩을 한 번 더 넣어 재발효시키는 방식이다. 단맛과 산미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며, 풍미도 깊어진다.
삼양주는 세 번에 걸쳐 술을 덧붓는 전통 양조 방식의 정수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맛이 복합적이고 부드럽다. 일부 전통 양조장에서 이 방식으로 정성껏 막걸리를 빚는다.

막걸리 재료
재료도 중요하다. 찹쌀을 쓰느냐 멥쌀을 쓰느냐, 누룩의 배합은 어떤가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강원도의 찹쌀막걸리는 산뜻한 신맛과 단맛이 균형을 이루며, 전라도의 막걸리는 구수하고 진한 맛으로 유명하다. 제주도의'오메기막걸리'는 차조로 빚어 씁쓸한 감칠맛을 자랑하고, 경상도의'안동소주'가 강한 도수의 증류주라면, 그 원형인 탁주는 지금도 안동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다.
이렇듯 막걸리는 '한 가지 맛'이 아니라 '백 가지 이야기'를 가진 술이다. 지역마다 물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사람의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걸리를'가장 인간적인 술'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계가 아닌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온 술이기에, 막걸리에는 술 빚는 사람의 성격과 기억, 그리고 그 땅의 기운까지 배어 있다.
막걸리라는 이름의 어원도 흥미롭다. 막 만든 술이라'막걸리', 혹은 술지게미를 걸러내기 전이라'막걸른 술'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본의 '도부로쿠', 중국의'니앙주'와 유사하긴 하지만,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공동체의 술'이라는 데 그 정체성이 있다.
예전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술독이 있었고, 명절이면 이웃과 함께 막걸리를 나눴다. 농번기에는 땀 흘린 농부들에게 한 사발 돌리는 것으로 하루를 위로했다. 그건 단지 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담은 문화였다. 오늘날 막걸리는 도시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하다. 누룩을 띄우고, 쌀을 씻고,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술'이 되는 것.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투박한 방식이지만, 그래서 막걸리는 더 진하고, 더 인간적이다.
지금 손에 든 막걸리 한 잔. 그 안에는 어쩌면 당신이 잊고 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억이 아스라이 스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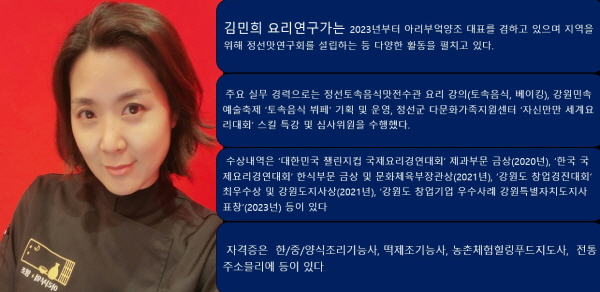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