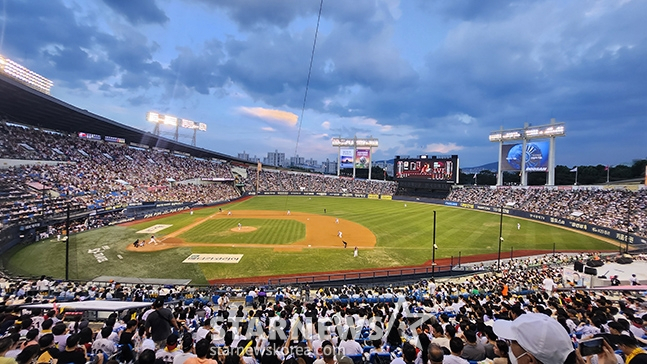
2025년 KBO리그는 1200만 관중(1231만 2519명·경기당 평균 1만 7101명)과 함께 입장 수입 2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10개 구단의 정규시즌 총 입장 수입은 약 2046억원으로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약 1595억원)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3년 전인 2022년 약 920억 원에 비하면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2022년은 필자가 마지막으로 구단에 몸담았던 해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변화는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다.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고 있고, 그만큼 구단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필자가 1997년 LG 트윈스에 입사했을 당시 "KBO리그가 평균 관중 2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다. 실제 1995년 LG가 평균 관중 2만 76명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처음으로 그 기준을 넘었다. 이후 LG가 2013년 한 차례, 롯데 자이언츠가 2008·2009·2011·2012년 네 차례 평균 2만 명을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 라이온즈(2만 3101명), LG 트윈스(2만 1725명), 롯데 자이언츠(2만 653명) 등 세 구단이 다시 이 수치를 돌파했다.
입장 수입 2000억 원이라는 건 10개 구단이 평균 200억 원씩을 올렸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의 '평균 관중 2만 명' 시대와 맞먹는 상징적 기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KBO리그가 총 입장 수입 2500억 원, 나아가 3000억 원 시대로 도약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야구장 좌석 규모의 확장성, 또 하나는 객단가의 상승 여력이다.
올해 KBO리그의 평균 좌석 점유율은 81.8%에 달했다. 특히 한화 이글스는 홈 73경기 중 62경기를 매진시키며 좌석 점유율 98.6%로 리그 1위를 기록했다. 올해 한화는 1964년 한밭야구장 대신 새 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첫 시즌을 보냈다. 신구장 효과는 분명하지만, 좌석 점유율이 98.6%에 달한다는 것은 동시에 '관중이 더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신구장 수용 규모 설계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착공 시점이 2022년 3월 22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시 프로야구 인기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화에 이어 삼성(96.5%), LG(91.2%), 롯데(90.4%) 역시 90%를 넘겼다. 이들 구단도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깝다.
KBO리그 초창기에는 한국시리즈 중립 경기가 있었다. 당시 지방 구장의 관중 수용 인원이 1만 명대 초반에 불과해 3만 명을 수용하는 서울의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어서였다. 서울 구단이 진출하지 않아도 한국시리즈 후반부는 매년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당시 지방 구장의 한국시리즈 개최 자격은 '3만 석 이상'이었고, 2010년이 돼서야 '2만 5000석'으로 완화됐다. 이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2014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2016년), 고척스카이돔(2016년) 등이 차례로 개장하면서 2016년부터는 잠실 중립구장 제도가 폐지됐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시리즈 개최 기준이 2만 5000석 수준이었기에 신축 구장들은 그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좌석을 다 채우는 경기가 드물었기에, 구단들은 '빈 좌석'보다 '관중으로 가득찬 좌석'을 원했다. 이에 일반석을 줄이고 프리미엄 좌석을 늘리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로 문학야구장은 2002년 개장 당시 3만 500석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2만 3000석으로 줄었다. 대신 바비큐존, 라운지석, 그린존 등 다양한 프리미엄 좌석이 생겼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이 80%를 넘었고, 2만 5000석 규모의 구장은 하나도 없다. 가장 큰 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2만 4000석)를 비롯해 2만 석 이상은 잠실(2만 3750석), 인천(2만 3000석), 사직(2만 2669석), 광주(2만 500석) 등 다섯 곳뿐이다. 나머지 구장은 모두 2만 명 미만이다. 올해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1만 7000명이 입장하면 매진이다.
야구장 수용 규모는 줄이기는 쉬워도 늘리기는 어렵다. 결국 관중과 입장수입 증가의 여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야구장의 수용 규모에 달려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청라돔은 인천SSG랜더스필드와 같은 2만 3000석 규모로 확정돼 있어서 논외로 치고, 향후 잠실돔과 사직구장 재건축에서 규모를 확대해야 리그 전체 관중과 입장 수입이 더 커질 것이다.
또 하나의 관건은 객단가다. 2022년 대비 2025년 입장 수입은 평균 122.4% 증가했지만, 객단가 상승률은 9.7%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13.5%로 추정되므로 실질 객단가는 약 3.3% 하락했다. *실질 객단가 = (1.097 ÷ 1.135) - 1 = -0.0335 (약 -3.3%)
팬들이 명목상으로는 더 비싼 입장권을 사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저렴하게 야구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객단가 인상 여력은 분명 남아 있지만 구단들이 입장료를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야구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야구가 '국민 스포츠'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3년 사이 객단가 상승률은 NC 다이노스(41.2%), 한화 이글스(36.9%), SSG 랜더스(24.7%)가 높았다. 한화는 신구장 효과가, SSG는 낮았던 초기 객단가의 정상화, NC는 좌석 고급화 전략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3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후) 관중이 돌아올까"가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결국 KBO리그가 입장 수입 2500억 원, 나아가 3000억 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신설 야구장 수용 규모의 확대와 ▶좌석 점유율 70%대 이하 구단들의 관중 증가가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급격한 입장 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객단가 상승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축이 맞물린다면 '입장 수입 3000억 원 시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앞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들은 야구장을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산업의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