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평짜리 꽃 돗자리위에서 추는 춤이 있다.
그 춤은 꾀꼬리 소리를 묘사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꾀꼬리 자태를 무용화 한 ‘춘앵전’이다.
중국 당나라의 제3대 황제 고종이 어느 날 아침 버드나무 위에 앉아 지저귀는 꾀꼬리의 소리를 듣고 악사를 불러 그 악사에게 꾀꼬리 소리를 음악으로 그대로 옮기도록 명하여 탄생된 음악을 춘앵전이라 칭하였다.
이후에 조선시대 순조의 아들 효명 세자가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 할 때 세자의 모친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40세를 경축하기 위해 춘앵전 음악에 춤사위를 입혀 ‘춘앵전 무’를 만들었다.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꾀꼬리 자태를 무용화 한 춤으로 명칭은 ‘춘앵전’으로 그대로 옮기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꾀꼬리를 묘사한 춤인 만큼 의상 또한 꾀꼬리를 형상화하는 황색이 기본이 되는 초삼을 입고, 양쪽 어깨에 걸쳐 길게 내려뜨린 초록색 띠는 꾀꼬리와 버드나무를 상징한 것이며, 손목에 끼우는 한삼은 한국의 전통 색상의 오방색을 변형한 색감으로 자주, 흰색, 빨강, 노랑, 남색 순으로 되어있다. 복식을 갖춰 입은 모습만 보아도 화려한 모습의 충분히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다

춘앵전의 춤사위는 동작 하나하나 표현하는 한자 명칭을 붙였는데, 복식을 갖춰 입은 무용수의 아름다운 자태만큼 춘앵전의 춤사위를 나타내는 한자 표현에서 시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자면 ‘낙화유수’(落花流水)라 해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좌우로 한 손씩 뿌리면서 돌아가는 동작을 표현 한 것이고 ‘이수고저’(以袖高低)라 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동작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하는 동작이다. 그리고 ‘탑탑고’(塔塔高)는 탑에 한 계단씩 올라가듯이 걸어 올라가는 느낌을 표현한 동작으로 한발씩 나갈 때마다 팔도 함께 차츰차츰 들어 올려준다. 또한 ‘풍류지’(風流枝)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두 팔을 허리 뒤로 여미고 오른발 앞 중 심 에서부터 왼발 뒤 중심까지 옮겨가는 동작이며, ‘화전태’(花煎態)는 꽃 앞에서의 자태를 보여주는 동작으로 춘앵전에서 가장 화사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동작을 할 때에는 치아를 들어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아한 미소를 짓게 된다.
이처럼 춤사위 하나하나 만들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춤사위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꽃잎이 떨어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계단을 오를 때에는 한 계단 씩 오르고, 바람에 흔들리듯 자연스럽게 팔이 흔들리듯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르려는 동작에서 반듯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춘앵전을 추다 보면 굉장히 정직한 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듯 이 춘앵전을 출 때에는 6자 크기의 화문석 위에서만 모든 춤사위가 이루어진다.
6자는 1평 길이의 넓이로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선의 한 평짜리 넓이 위에서 모든 동작이 진행된다.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진 춤사위와 한 점을 축으로 중심을 이루고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발을 정확히 90°씩 놓고 들어 360°도를 도는 동작은 전후좌우의 대칭으로 몸 방향에 있어 오직 정면과 옆, 그리고 뒤쪽으로만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춤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반듯함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춘앵전은 한국무용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고요하고, 차분하며 감정 표현이 억제된 절제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따르라는 교훈을 주는 듯한 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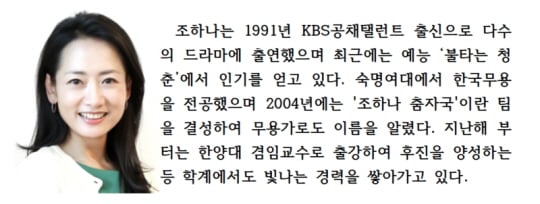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러리 '용기의 時代' ] 송경흡 01. 양만춘, 전설의 시작](https://thumb.mtstarnews.com/cdn-cgi/image/f=jpeg,w=100,h=100,fit=cover,g=face/21/2025/08/202508041047034264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