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용설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 역신을 몰아냈다
이 부드러운 이야기의 춤을 폭군 연산이 추어 ‘광기의 춤’이 되어버렸다.
조선시대 10대 왕 연산군이 말을 타며 춤을 추거나, 설화 속의 처용탈을 쓰고 칼을 휘두르는 등, 할머니인 대왕대비(소혜왕후)에게도 마치 역신인 양 칼을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는 춤 ‘처용무’가 ‘광기의 춤’으로 치부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광기의 춤’은 원래 악운을 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처용무’다. 처용무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중앙을 중심으로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5명의 남자 무용수들이 추는 춤으로 무용수들은 각각 방향과 색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는다.
중심이 되는 중앙에 노란색, 서쪽에 흰색, 동쪽에 청색, 북쪽은 검은색, 그리고 남쪽은 붉은색으로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화려한 의상과 사람 형상의 커다란 가면을 착용하고 장엄하고 활기찬 춤사위가 이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특한 처용무의 유래는 신라 제49대 국왕 헌강왕이 개운포에 놀러 갔다 돌아오는 중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캄캄하게 덮여 길을 잃게 되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물으니 길흉을 판단하여 예언하던 관직인 점성관이 “이는 동해의 용이 부리는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해 이를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왕이 용을 위해 이 근처에 절을 지으라 명령을 내리자 안개가 흩어져 먹구름이 걷혔다고 한다.

이에 대왕의 덕을 칭송하며 동해의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위로 솟아올라 춤을 추었다. 7명의 아들 중 ‘처용’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들 한명이 왕의 정사를 돕도록 하여 헌강왕을 따라왔다. 왕은 미모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주고 벼슬을 주어 경주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처용은 천연두를 옮기는 역신이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고자 사람으로 변신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에 노하지 않고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때 역신은 처용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그의 비범함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처용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이때부터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두면 악귀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는다고 하였다.
처용무는 신라시대 처용설화에서 비롯되어 고려시대에는 남성 혹은 여성 무용수 1인이 공연하여 나례 의식뿐만 아니라 궁중 연회나 다양한 행사에서 연희 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에 이르러서 남성 무용수 5명이 함께 추는 좀 더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 궁중무용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라시대 부터 추어온 처용무는 춤의 역사적 시간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탈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 한국 궁중무용인 처용무는 설화 속 처용의 가면을 쓰는데 무용수들이 쓰는 커다란 탈의 모양새는 팥죽색 피부에 새하얀 치아 그리고 양쪽 귀에는 납으로 된 구슬과 주석의 귀고리가 달려 있다. 또한, 이 탈은 관복을 입을 때 쓰는 검은색 모자로 검은색 관위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 두 송이와 귀신을 쫓는 벽사(辟邪) 성격의 복숭아 나뭇가지와 열매 7개가 꽂혀 있다.
그래서 처용탈을 보면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이국적인 모습의 형상이 꼭 아랍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에서 탈을 한국인의 형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신라와 서역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신라 사회에 정착해 있던 이슬람 상인의 낯선 모습이 당시 신라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처용을 아랍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당대의 상황이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의미를 지닌 설화의 재료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인 처용무는 2009년 유네스코는 인류 무형유산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용무가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독특한 춤사위도 있겠지만 가무(歌舞)로써, 사악한 것을 쫓고 경사스러움을 맞아들인다는 월등한 정신적 기질 또한 인정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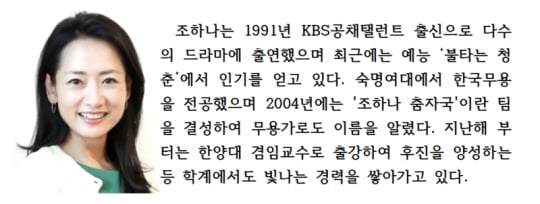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