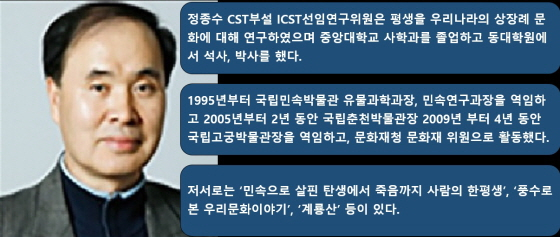'태정태세문단세'로 시작되어 '정순헌철고순'으로 끝나는 운율, 조선시대 27대 왕들의 묘호다.
대학 3학년 때 강의 시간 중 "어느 왕은 조를, 어떤 왕은 종을 붙이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교수님의 답변이 참으로 걸작이다. "옆구리서 나면 조 자를, 밑으로 나면 종 자을 붙인다"고 했다.
옆구리로 난다는 것은 적통이 아닌 창업군주로. 즉 고려 태조 왕건에서 조선 태조 이성계로 창업 군주의 성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는 것을 이른다. 밑으로 난다는 것은 일종의 순산으로 창업군주를 이은 왕을 가리킨다.
태조니 태종이니 세종이니 하는 이름은 왕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에 고하고 신위를 모시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종묘의 묘 자를 써 묘호라 한 것이다.
이런 묘호는 어떻게 붙이는가. 묘호는 시호와 달리 반드시 두 자로 앞에 시자(諡字)와 뒤에 종호(宗號)로 구성된다. 이런 묘호법은 주나라 제도에서 비롯됐다. 조와 종에 관한 법도는 '예기'에 별자(나라를 세운 자)가 조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자는 종이 된다 했다.
나라 새로 세운 창업군주는 그 공을 인정해 조를, 이하 수성한 왕에게는 덕이 크다 평가해 모두 종 자를 붙인다. 즉 묘호는 조공종덕(祖功宗德)으로 공이 있는 왕은 조를, 덕이 있는 왕에게는 종을 쓴다.
고려와 조선을 창업한 왕건과 이성계도 태조라 했고, 중국 한나라는 고조로, 북위·당·송·명·청의 경우는 모두 태조라 불러 창업 시조임을 나타냈다. 창업 군주에게만 조를 붙인 것은 한 나라의 시대를 연 창업자인 동시에 그 나라 자손들의 시조라는 뜻이다. 조 앞에 '클 태太' 자를 붙여 태조라 칭한 것은 시초를 의미하며 그 이상은 없다는 최상의 칭호이다.
묘호는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가. 묘호는 의정부·육조·집현전·춘추관·사헌부·사간헌 등 2품 이상의 대신들이 모여 왕의 재위 시 행적을 따져 정한다. 태조부터 문종까지는 아직 왕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사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정했다.
순조의 경우 닷새째 되는 날 입관하고 여섯째 날 상복으로 갈아입고 11월 19일, 죽은 지 7일 만에 묘호를 결정하였다. 묘호는 순종, 선종, 목종 삼망 중 순종(철종 때 순조로 추존)으로 낙점했다.
간혹 왕들이 생전에 자신의 묘호를 암시하기도 했다. 태종의 묘호는 사전에 정해졌다. 세종은 부왕이 승하하면 반드시 태종이란 묘호를 쓸 것이라고 했다. 태종이 1422년 5월 10일 승하하자, 세종은 3개월이 지난 동년 8월 8일에 묘호를 조공종덕 원리에 따라 태종이라 하였다. 태종은 태조와 함께 나라를 세운 공덕이 가장 큰 사람에게 붙이는 묘호로, 예로부터 개국한 군주를 태조라 하고 태조를 계승한 이를 태종이라 해왔다. 중국에서도 송나라와 청나라 등이 태조 다음 황제를 태종으로 하였다.
세종의 묘호는 문종과 세종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팽배했다. 신료들은 세종이란 칭호를 쓰면 덕행을 기록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문종을 주장했으나, 왕은 북방을 개척한 공훈을 이유로 들어 세종으로 정했다. 대개 세종이란 나라를 중흥하였거나 창업 군주에게 주어지는 묘호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창업군주인 별자만이 칭조를 한다고 했는데, 세조·선조·영조·정조·순조는 창업 군주도, 그렇다고 인조처럼 반정으로 즉위한 왕도 아닌데 왜 조를 붙였을까. 조와 종은 같은 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데도 조선의 국왕들은 중국과 달리 종보다 칭조를 더 큰 효라 여겨 묘호를 논할 때 조를 붙여 부왕의 공덕을 높이고자 하였다.
창업 군주도 아닌 세조는 어떻게 조 자를 붙여 칭조를 한 것인가. 예종은 "대행대왕께서 나라를 새로 세운 공덕은 일국의 신민으로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묘호를 세조라고 일컬을 수 없는가?"라며 칭조를 주장하였다. 대신들은 세조를 묘호로 쓰지 않은 것은 이미 세종이란 묘호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지만, 예종은 "한나라 때에 세조가 있고 또 세종이 있었는데, 이제 세조로 하는 것이 어찌 거리낌이 있겠는가?"라며 다시 논의토록 했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 단종을 몰아내고 이징옥과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등 종사의 중흥을 도모하였다는 명분과 아우로서 형인 문종을 계승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세조로 결정되었다
조선왕조 27대 임금 중 가장 무능한 군주를 들라하면 난 서슴없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선조와 인조를 든다. 두 임금은 조선 최대의 국란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전쟁 후 이들의 행보는 민심과는 정반대였다.
선조는 변덕이 심하고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이용해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다. 선조의 묘호는 원래 선종이었으나 왜구를 물리치고, 종계를 개정(태조 이성계가 명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아들로 된 것을 바로잡음)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광해군 8년 추존하여 선조로 바꾸었다.
인조는 성격과 치세와 정반대의 뜻을 담은 묘호다. 묘호의 시 자 '인仁'의 뜻과는 달리 인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큰아들 봉림대군, 장손, 큰 며느리까지 다 죽인 악랄하고 고약한 군주였다.
효종은 부왕 인조의 묘호를 논할 때 아예 처음부터 칭조를 고집했다. 양란을 무사히 넘겨 종사를 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덕을 지키고 업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진 열烈'자를 써 열조라 했다.
영조의 최초 묘호는 영종英宗이었으나 1899년 12월 고종에 의해 영조로 추승되었다. 고종과 대신들은 영조의 '영' 자에 대해 실로 문무의 뜻을 다 갖추고 있으며 참으로 진선진미하다며 더할 나위 없다고 찬양하였다. 정조의 묘호는 원래 정종이었으나,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4대를 추숭하는 과정에서 정조로 칭조됐다.
한편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폐군이 됨으로써 종묘에 신주도 봉안되지 못하였고 묘호도 없이 단지 '군(君)'자를 붙여 불렀다.
고려도 중국의 예를 본받아 태조 왕건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모두 종으로 묘호를 칭하였다. 그러나 원나라의 지배로 말미암아 기존의 조, 종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 충렬왕 때부터는 조, 종의 묘호 호칭을 한 단계 낮추어 왕자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원나라에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왕 자 앞에 충忠 자를 붙여 충렬왕이니 충선왕이니 하였다.
한마디로 중국과 대등한 조.종의 묘호에서 '한 단계 낮춰 '왕' 자를 붙인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원나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충' 자를 붙이도록 했으니 이보다 심한 모욕이 어디 있는가.
-정종수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ICST) 선임연구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 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 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