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해녀의 지도'라는 말로 이어령의 '생명이 자본이다'의 프롤로그는 시작되고 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 책은 책이 아닙니다, 한 장의 지도입니다'로 이다. 즉 이 책은 우리의 삶에 대한 네비게이션이라는 의미이다. 바닷속 깊이에 따지 않고 숨겨둔 전복을 따기 위해서 숨 고르기를 하는 해녀처럼 이어령 선생은 이 책에서, '생명이 자본'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육로, 해로, 항로 등 세상의 지도처럼 그려보고 싶으나, 어디에도 그릴 수 없는 해녀의 물길. 그려볼 수 없는 물길처럼 우리의 살갗보다 더 깊은 마음, 마음보다 더 높은 영혼 속에 그린 '생명의 유레카를,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지도로 그려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80이라는 나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던 시간에 이어령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찾아낸 단어가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의 'Resignation'이라고 하였다. 칼 폴라니의 저서 '대전환'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Resignation'을 '체념'으로 번역한 것에서 이 선생님은 '감수'(甘受)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감수하다라는 것을 '쓴 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삶의 존엄한 태도라는 해석이다.
'감수한다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힘과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었다. 인간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육체적 생명의 의미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잃어서는 안 될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잃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한층 더 두려운 것이라는 진실을 감수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나의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 시대의 인간은 자유의 종언을 뜻하는 현실의 진실을 감수해야 하며 극 경우라 해도 여전히 생명은 그 감수하는 것에 의해서 태어난다', '대전환'의 끝부분에 있는 이 글 속에는 감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렇게 시작된 '생명이 자본이다'는 생각의 시작으로 '금붕어 유레카'라는 추운 겨울밤 연탄불이 꺼져 어항의 살어름 속에 화석처럼 박힌 세 마리의 금붕어 살리기 이야기다. 선생님은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오시더니 뜬금없이 금붕어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참 난감했었다.
얼었던 금붕어가 따듯한 물을 부어서 살아난 그것이 '유레카'를 외칠 정도일까? 라고 생각했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살만한 세상을 살기, 사람답게 살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게 '금붕어 유레카'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도 2년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정말 내 삶의 '유레카'가 되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기계가 사는 세상인지, 동물 같은 인간들이 사는지 가끔은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이때라서 더 생명을 이야기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발 우리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싶은 뉴스들이 넘쳐난다. '동물문화, 식물문화…, 또는 악마들의 문화'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의 단어가 붙습니다.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담론에 따라서 교양으로서의 문화, 진보로서의 문화,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상징 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로 분류한다고 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만 문화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존엄한 삶으로 2023년이 마무리되기를 감히 바래 본다.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자리가 인간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 있으면 한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다만 잠자코 그 언저리를 가늠할 뿐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었는가? 돈인가? 물건인가? 혹은 사람인가? 무엇이든 그를 향한 마음이 반反 생명적인 사랑, 라이크라면 안 된다. 생명과 사랑은 붙어 다닌다. 즉 러브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생명이 자본이다 p. 321)
생명과 사랑은 붙어 다닌다고 이어령 선생은 늘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없이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는 그저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K팝을 온 세계에 우뚝 서게 한 BTS의 멤버들도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을 잊을 수 없다. 도마 체조 선수인 여서정이 도마 경기가 펼쳐지는 4초 동안을 위해서 보내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된다.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만으로 생각해도 그 1초를 위해서 1년씩은 훈련해야 했다고 생각해 본다.
며칠 전 티비 프로에서 바르셀로나의 건축가 가우디의 삶을 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건축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것으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빛이 나고 있다. 바르셀로나 전체를, 스페인 사람들의 위상을 그 문화의 가치를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한 단계 이상 올려놓은 것이다.

문화는 올바른 것이어야 문화가 될 수 있다. 비상식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거스르고는 문화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이다. 그 자체도 살아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23:10) 라는 말도 성경에 있다.
문화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애쓰는, 감수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자기의 길을 사랑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를 지켜내는 삶이 생명이 자본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낸다고 생각된다.
이어령 선생은 '생명이 자본이다', 이 책을 발표하시고 9년을 더 사셨다. 그 9년이라는 시간을 작별의 시간으로 여기며 사셨던 것 같다. 선생님의 책 제목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들을 보면, 많은 것을 감수해 내시며 어느 해녀처럼 그의 숨겨둔 전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나의 우둔함을 나는 감수(甘受)하기가 어렵다. 선생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신 듯 '실망하더라도 거기 찾던 전복이 없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생명의 바다에 뛰어들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2023년, 올해가 다 가는 즈음에 '생명이 자본이다'를 새삼스레 또다시 읽어본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바다에 또 뛰어들 숨 고르기를 하며 새 아침을 시작한다.
- 서승옥행정사법인 CST 부설 ICST의 전문위원
'생명이 자본이다'(이어령, 마로니에 북스, 2014)
이어령(1934.11~2022.02); 초대 문화부 장관,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으며, 130여 권의 저서 중 대표적인 저서로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한 60년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일본인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한 문명론으로 80년대 '축소지향의 일본인', 디지로그에 이어 '생명자본주의'의 신어로 21세기에 새로운 문화의 방향을 제시한 2010년대 '생명이 자본이다' 가 있다.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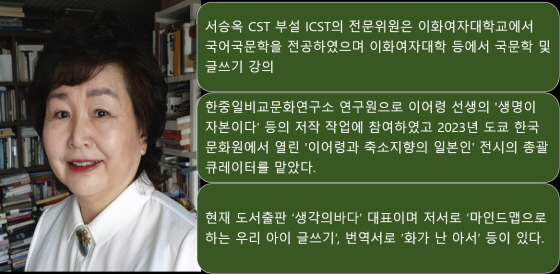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