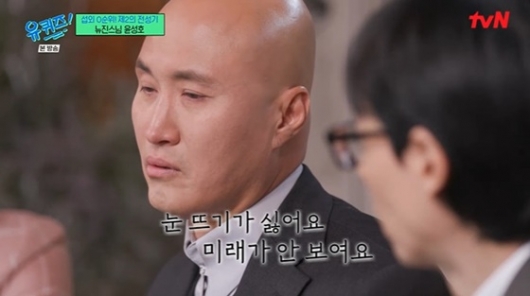|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에서 영화사 중역 그리핀(팀 로빈스)은 시나리오를 심사받으려는 작가들에게 “줄거리를 두 줄로 요약해보라”고 말하는 게 일이다. '원티드'는 그리핀이 반색할 그런 영화다. 줄거리를 두 줄 아니라 한 줄로도 줄일 수 있다. ‘찌질이 주인공이 천부적인 킬러로 거듭나 악당들을 마구 죽인다.’
영화 후반부에 반전이 살짝 끼어들기는 해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앞만 보고 달리는 줄거리에 그나마 단 하나 있는 반전이라 미리 알았다가는 김이 샐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래픽 노블 작가 마크 밀러의 만화책이 원작이라는데, 아쉽게도 원작을 구하지 못해 얼마나 각색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뿐이다. 주인공 웨슬리가 어떻게 킬러로 거듭나느냐.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은 이 부분에서 아주 막나간다. '원티드'의 황당무계하면서도 화려한 액션에는 현실성이란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다. 총알과 총알이 맞부딪히고 심지어는 총알이 쏘는 사람 마음대로 막 휘기도 한다.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란 법은 없다’고 믿으며 채찍을 때리듯 스냅을 줘서 요령껏 쏘면 그렇게 된단다.
아무리 상처를 깊게 입더라도 촛농 비슷한 것으로 목욕을 하면 씻은 듯이 낫기도 한다. 킬러 조직은 역사가 1000년이나 됐다지만 운영되는 모양새는 숫제 상식 밖이다(그들에게 지령이 전달되는 과정은 꽤나 그럴싸하다. 그러나 누가 그 지령을 내리는지는 ‘운명’이란 단어 말고는 끝내 설명되지 않는다). 슈퍼 히어로 영화보다 더 능청스레 거짓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진지한 킬러 영화 행세를 해댄다. 너무나 뻔뻔해서 오히려 상쾌할 지경이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보란 듯이 메시지를 주장한다. 어찌나 정색을 하고 웅변하는지, 마지막 장면만 보면 올리버 스톤 영화인 듯한 착각마저 든다. 그 메시지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신세를 벗어나려거든 팔자타령만 하지 말고 뭐든 하라.’
러시아 출신인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은 저예산 영화 '나이트 워치'로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재주 하나만큼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다(쿠엔틴 타란티노는 그를 두고 “의심할 여지없는 최고의 비주얼 스타일리스트”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할리우드가 그를 불러들인 까닭도 그것 하나. 자본의 키스에 고무된 베크맘베토프 감독은 물을 만난 듯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펼쳐 보인다. 자동차가 허공을 떠다니다 못해 심지어 기차까지 벼랑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안젤리나 졸리는 언제나 그랬듯 매력적이다. 여신 같은 그녀가 운전대를 발로 조종하며 허리를 꺾은 채 총을 쏴댈 때, 가슴 두근거리지 않을 남자, 몇이나 될까. 제임스 매커보이는 '어톤먼트'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데, 썩 나쁘지 않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줄거리를 줄이듯 나 또한 결론을 한 줄, 아니 한 단어로 줄여보겠다. 괜찮다. '원티드'의 액션은 수준급이며 주장하는 주제 의식도 관객층(아무래도 젊은 관객이 많을 테니까)에 걸맞다. 단, 어깨에 힘을 풀고 ‘그래, 어디 한번 폼 좀 잡아보라’는 식으로 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저게 말이 돼?’ 하는 식으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영화가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말이 되는 영화를 찾으셨다면 '원티드'는 번지수가 다른 영화다.
<김유준 에스콰이어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