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89년 겨울 그 즈음, 그의 음악을 처음 들은 건 비좁은 독서실에서였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박학기의 소리는 귓가를 잔잔히 맴돌더니 이내 살 속 깊숙하게 밀려들었다. 박학기 1집 B면 첫번째 곡, 그러니까 요즘의 CD로 따지자면 6번 트랙곡 '내 소중한 사람에게'였다. 안개 속처럼 보이지 않는 듯 쏟아지는 박학기의 은은한 소리는 비켜갈 수 없는 대학입시의 굴레에서 단비를 뿌려준 존재였다. 그 음반에 수록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이미 그댄' '향기로운 추억'은 음악팬들에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명곡이었으며 추억으로 존재하는 명반이었다.
그의 음악을 처음 대면한지 20년 만에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그에게 1집 음반 '내 소중한 사람에게'에 대한 향수를 전하며 나즈막히 한 소절 불렀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었냐며 웃어보였다. 노래의 힘이란 그런 것이다. 세월이 지나도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화석 같은 추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의 아내를 위한 연가였다며, 우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그날 밤 곡을 써내려간 노래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모든 일상의 부딪힘과 깨달음은 뮤지션에게 있어서 일종의 감흥인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옮겨 놓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유다. 요리로 따지자면, 마치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는 맛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의 음악은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고 고유의 향이 들어가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손맛이 서려있는 것으로 비유할만하다. 비음의 밀고 당기는 맛은 박학기만이 가지는 일종의 튼튼한 무기다.
'박학기'라는 뮤지션이 지금의 1,20대들에게 낯선 이름이라는 존재감은 우리 가요계의 음악적 기반과 연속성 부재를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다. 세대를 떠나 음악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법이다. 들려주지 않으니 음악을 들을 방법이 없다. 모든 미디어 매체는 트렌드 음악으로 현란하게 무장한 채 오늘의 음악을 있게 한 음악적 계보를 단절시키고 인간적 감성과 서정에 앞서는 말초적 음악듣기를 대중에게 앞다퉈 강요한 씁쓸한 결과다.
박학기 음악의 태생은 통기타다. 포크음악이 시대의 찬서리를 맞고 우리곁에서 밀려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암담하다. 고인이 된 김광석과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박학기는 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함께 포크음악의 중심에 서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의 음악적 행보도 공연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색깔은 사뭇 달랐다. 김광석이 폐부를 찌르는 직선의 소리라면 박학기는 온몸을 감싸는 울림의 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당시 포크 음악의 볼륨을 더욱 확장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적 서정을 노래한 이들은 90년대를 이어오며 우리 가요의 획을 그었던 불굴의 뮤지션으로 기록되고 있다.
박학기는 그 동안 6장의 음반과 베스트 음반을 통해 '자꾸 서성이게 돼' '유난히' '아름다운 세상' 등 주옥같은 음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국 포크음악의 상징적 뮤지션으로 존재감을 키워냈다. 최근, 6년만에 신곡을 담아낸 '비타민'으로 대중에게 회귀한 박학기의 음악적 이음새는 여전히 튼튼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민다. 그의 두딸 '정연, 승연'과 함께 부른 '비타민'은 그가 말하는 음악을 통한 긍정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을만큼 넉넉해 보인다.
음악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삶을 발견한다는 박학기의 복귀는 김광석의 울림을 잇는 음악적 향연으로 기대하게 한다. 20년 전 추억을 끄집어내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뮤지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닌가. (강태규 / 대중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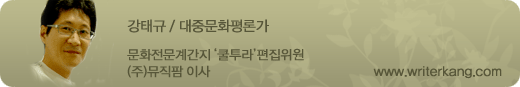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