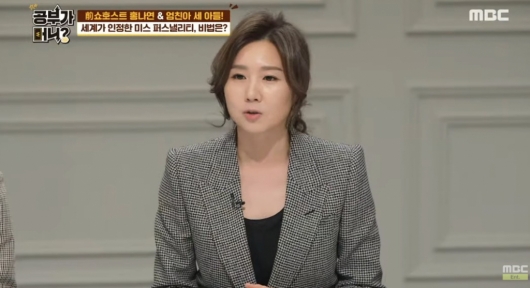|
역시 그는 문제적 감독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13일(현지시간) 오후 5시 제 64회 칸 국제영화제의 드뷔시 극장에서 최초로 상영된 신작 '아리랑(Arirang)'을 본 뒤 든 생각입니다.
'아리랑'은 한 마디로 김기덕 감독의 1인 영화입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서, 자신에게 스스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아리랑'은 두 가지 면에서 보는 이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할 만큼 파격입니다. 원색적인 내용 그리고 영화 문법에 도전한 형식이지요.
내용은 일단 한국 영화계가 뜨끔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김기덕 감독이 후배 감독에게 배신당해 폐인이 됐다더라'는 논란을 스스로 봉합한 그는 소주 기운을 빌린 셀프 인터뷰에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 후배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총이나 도끼를 이용한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화, 내용보다 스타일에 더 집착하는 사람을 운운한 부분에선 절로 특정 영화감독이 떠오릅니다. 정부에도 "(상이나 훈장을) 영화를 보고나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일갈하지요.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도 드러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만들 정도로 뛰어난 손재주가 있는 그가 사제 권총을 만들어 어딘가를 찾아가 총을 쏘길 반복하는 장면은 의미심장합니다.
형식의 파격 또한 이에 못지 않습니다. 감독은 디지털 카메라로 술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편집하고 자문자답하면서 꼬박꼬박 이를 카메라에 담아 편집했습니다.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다 그만 눈물도 흘립니다. 소위 말하는 셀카고, 극단적인 혼자놀기로도 보입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참 섬뜩한 욕설을 퍼붓기까지 합니다. 'damn', 'idiot', 'bastard' 등 몇몇 단어를 돌려쓰는 데 급급한 영어 자막이 심심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 또한 영화"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 셀프 카메라 자체 또한 영화가 아니냐면서요. 부산영화제 전찬일 프로그래머는 "영화라는 형식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걸 영화로 만든 김기덕 감독이 대단하고 그걸 또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한 칸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인 저로선 인터뷰이가 너무도 직접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쏟아낸 '센' 인터뷰를 마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인터뷰에 등장한 다른 이들이 걱정되는 한편,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인터뷰이 자체가 화살을 맞지 않을까 또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늘 직설화법을 구사해 온 김기덕 감독은 이미 그런 화살을 꽤 많이 맞았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3년간 영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고 3년만에 새 작품을 꾸준히 만드는 한국 감독이 손에 꼽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유난스러운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기덕입니다. 1996년 '악어'부터 2008년 '비몽'까지 13년간 무려 15편의 영화를 만들며 왕성한 창작욕을 과시했습니다. 스스로 "미친듯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고백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100분의 치열한 자기 고백을 통해 이야기한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와 애정일 것입니다. 불과 8년 전 영화인 '봄 여름 가을 겨을 그리고 봄'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걸 보며 꺼이꺼이 우는 반백의 현재 모습보다 얼마나 앳되던지, 그만 서글퍼졌습니다. 그가 택한 방식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퍽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 어린애처럼 순진한 마음만은 오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이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만들고자 했던 차기작은 아직 만들지 못했죠. 그 영화를 손꼽아 기다려보겠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