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장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넓고도 깊다.
매년 가을이면 국회는 국정감사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신성한 자리여야 할 국정감사장이,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망신을 주는 '인격 살인'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인이나 일반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실명이 거론되며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까?
헌법상 면책특권의 강력한 보호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이 '직무상 발언'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편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보고서 배포 등의 행위까지도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나 발언은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면책특권이 뚫리는 예외적 상황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용서받는가? 법원은 예외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언 내용이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악의적인 허위 폭로'나 '직무 무관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실적 한계와 입증책임의 벽
문제는 현실이다. 피해자가 국회의원에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없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이 미흡했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면 면책된다고 보았다. "제보를 믿었다", "의혹 제기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구조다.
피해 구제의 우회로와 제보자의 책임
국회의원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제보자'다.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이를 공론화하게 만든 경우, 제보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는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면 제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 밖에서(예: 개인 SNS, 별도 기자회견) 반복된다면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바늘구멍 뚫기'와 같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허위 사실 유포의 합법적 허가증'은 아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국회 내부 징계는 별도로 가능하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특권의 무게를 인식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품격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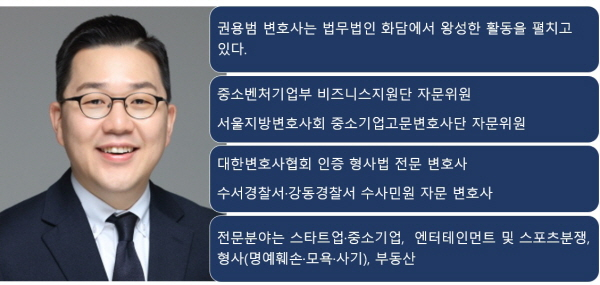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