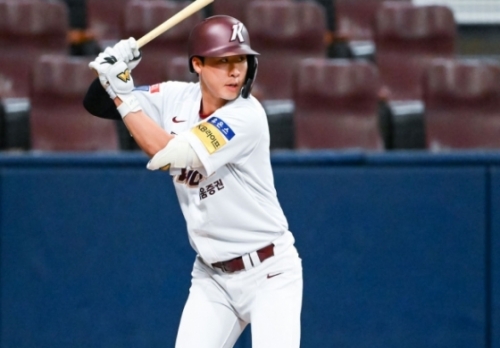|
섹슈얼하며, 약간은 음탕한 의미마저 지니고 있던 ‘롤리타 콤플렉스’는 이제 대중문화의 한 분야가 될 만큼 중립적인 의미가 되었다. ‘롤리타 룩’은 패션 아이콘이 되었고, ‘롤리타’라는 이름이 들어간 향수도 나와 있을 정도. 어쩌면 ‘롤리타 콤플렉스’는 더 이상 가슴 떨리는 그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
원래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1955년에 쓴 소설에서 유래한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1962년에 스탠리 큐브릭이 <롤리타>라는 영화를 내놓으면서 대중 문화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큐브릭의 <롤리타> 이전에, 큐브릭의 <롤리타>보다 더 강렬하게 ‘롤리타 콤플렉스’를 보여준 영화가 있으니 바로 엘리아 카잔 감독의 <베이비 돌>(56. 사진)이다.
나보코프의 소설이 나온 바로 다음해에 등장한 이 영화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하지만 제작 당시 검열 당국과 종교 단체의 탄압과 압박으로 3년 동안 개봉하지 못하고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영화라는 점에서, 나보코프보다 먼저 ‘소녀 판타지’에 대해 이야기한 셈이다.
주인공은 그저 ‘베이비 돌’(캐롤 베이커)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뿐이다. 18세 때 시집 온 그녀의 남편 아치(칼 말덴)는, 족히 ‘어린 신부’보다 두 배 이상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에, 아치는 그녀의 스무 번째 생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목화 씨를 틀어 솜을 만드는 ‘조면’ 사업을 하던 아치는 난관에 봉착한다. 마을에 큰 조면 공장이 생긴 것. 실바(엘리 월러치)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아치의 적이 되었고, 앙심을 품은 아치는 실바의 공장에 불을 지른다. 아치를 수상하게 여긴 실바는, 일을 맡기겠다는 핑계를 대고 아치의 집으로 온다. 이때 실바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베이비 돌. 베이비 돌 또한, 남편에 비해 훨씬 섹시하고 잘생긴 실바에게 끌린다.
1956년 개봉 당시 <베이비 돌>에 ‘더러운 영화’라는 낙인이 찍혔던 건, 이 영화가 감히(!) ‘소녀의 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원작자인 테네시 윌리엄스는 당시 무너지고 있던 미국의 성 모럴과 가족의 가치를 비판하기 위해 <베이비 돌>을 썼지만, 보수주의자들의 눈엔 한 순결한 소녀가 점점 성적 쾌락을 알아가는 과정이 불쾌할 뿐이었다. 물론 이 영화엔 그 어떤 노출 장면이나 섹스 장면도 없다. 하지만 엘리아 카잔 감독은, 미묘한 뉘앙스와 암시와 느낌만을 통해, 오로지 작은 스킨십 하나만으로도 걸쭉한 정사 신 못지않은 섹슈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쩌면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한 메타포가 있었기에 당대의 문제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원작자의 희망대로 마릴린 먼로가 주인공을 맡았다면, 그 느낌은 더욱 노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대 25세였던 캐롤 베이커 또한 백치미와 소녀적 천진함이 잘 조합된 연기를 보여주었고, <베이비 돌>은 성적 억압과 도덕의 붕괴와 감출 수 없는 욕정이 뒤엉킨, 시대의 논쟁작이 되었다.
<김형석 월간스크린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