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년을 넘어 현재까지 전승된 우리의 귀중한 유산 춤, 춤의 시작은 자연에 대한 숭배 또는 자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해진 종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무용 개념으로 인식되는 전통무용은 크게 민간에서 추어져 내려온 민속무용과 왕실 중심으로 연희된 궁중무용으로 나뉜다.
한국 무용사를 보면 긴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전승되어온 우리의 소중한 춤 유산의 궁중 무용은 삼국시대에서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대의 정치이념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궁중무용도 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왔다.
궁중의 경사스러운 잔치에 연행되던 궁중무용은 정재(呈才)라고도 하는데 조선 초기부터 차츰 춤 뒤에 정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종 때 왕명에 따라 제작된 악전 ‘악학궤범’(樂學軌範)을 비롯하여 궁중의 각종 잔치에 관한 의식을 적어놓은 책 ‘진연의궤’(進宴儀軌) 및 고종 30년 편찬된 정재의 절차를 기록한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笏記)에 이르기까지 궁정에서 연행되는 춤을 가리켜 정재라는 말을 곁들여 사용하고 있다.

정재무는 민속무용과 달리 화려한 의상과 정적이고 내재적인 율동미에 치중하며 대형화된 구성을 볼 수 있으며 절재 된 춤사위와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재무는 그 춤의 계통에 따라서 ‘당악정재’(唐樂呈才)와 ‘향악정재’(鄕樂呈才)로 구분되는데 고려 시대 송나라에서 궁중 무용이 들어오면서 붙여진 이름이 당악정재무 이며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게 창작된 것이 향악 정재무다.
두 정재무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는 의식에 쓰이는 도구나 물건을 의물이라 하는데,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등, 퇴장 시 인도하는 역할의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드는 의물 즉 ‘죽간자(竹竿子)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당악정재는 죽간자를 들고 무용수가 등·퇴장하며 송축의 뜻을 담은 한문 가사를 노래하는 반면 향악정재는 무용수를 무대로 인도하는 죽간자가 없고 공연 도중에 무원들이 부르는 그날 행사의 행해지는 춤의 내용을 담은 노래 창사의 가사가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되어있다.

향악정재는 순조 때 새로운 정재가 많이 창제되었는데 ‘춘앵전’이나 ‘무산향’ 같은 독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의 문헌 기록에는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구분이 명시될 정도로 분명했으나 조선 후기에 창작된 정재에서는 당악정재와 향악정재로 구분한 기록이 찾기 힘들고 형식적으로도 크게 차이점이 없었다. 다만 당악정재는 죽간자만이 남아서 구분이 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향악정재 화 되어 한국적 정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외교 수단으로 예와 악을 중요시하였던 조선시대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을 관장할 곳을 중앙에 두어 춤과 음악을 제정하고 악정을 바로잡았으며 정권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창제된 정재는 예술적이라기보다는 개국 창업을 칭송하고 왕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춤이었다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와서야 나라의 태평성대나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흥겨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뤄 춤다운 춤을 만들게 되었다. 또 민족적 정서를 되살려 우리의 고유한 예술성을 형상화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면서 궁중무용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여러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한국의 궁중무용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귀중한 춤의 유산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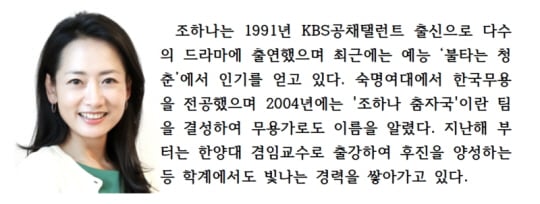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