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똥’ 이란 단어를 말할 때 어린아이들은 왠지 신나한다. 반대로 성인들은 눈살을 먼저 찌푸리고 배설물이라는 점으로 혐오스러워한다.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똥’이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처’가 ‘똥’이 되는 내용의 무용 공연이 있다.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 조명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새하얀 방석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객들은 그 물체가 무엇인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거나 실눈을 뜨며 확인하려 애를 쓴다.
“설마 똥은 아닐 거야”라는 머릿속 생각의 결론이 나기 전에 무용수들은 그 물체 덩어리를 쭈물거리더니 사람의 형태로 빚어냈다. 설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똥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똥이 되어 한 줌의 흙덩이로 돌아간다는 윤회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부처' 와 '똥'이라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과감하게 사용했던 이 공연은 2001년 초연으로 현대무용가 홍승엽의 작품 ‘빨간 부처’다. 붉은색이 주는 강렬함과 순종적이지 않는 도전적인 느낌이 강해서인지 제목에서 느껴지는 ‘빨간 부처’는 기존 부처의 이미지와는 다른 반대 성향을 띠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홍승엽은 이 작품에서 빨간색은 인간의 세속을 상징하고, 부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현대인을 상징했다. 그래서 ‘빨간 부처’는 현실 환경에 충실하면서도 끝없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려는 인간이며 이 인간의 고뇌하는 몸짓을 빨간색이 가진 색감의 이미지로 총 3장으로 구성하여 그려내고 있었다.
1장은 정체성을 잃고 고민하는 인간들의 여러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2장에서는 인간의 고뇌와 번뇌가 점점 깊어져 가는 과정을 그려냈으며, 3장은 무용수들의 춤을 통해 번뇌를 날려 버리는 것으로 묘사했다.
정체성은 인간 각자 다르기에 이 작품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 정답 대신 마지막 3장에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움직임에 힘을 주어 인간의 몸짓으로 감동을 주고자 했으며 재미를 잃지 않는 해학과 위트 넘치는 안무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실 홍승엽은 ‘빨간 부처’ 이전부터 2000년 '데자뷔'로 권위 있는 프랑스 ‘리옹 댄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안무가이다. 이외에도 ‘달 보는 개’, ‘싸이 아프리카’, ‘아큐’, ‘벽오금화’ 등 훌륭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그가 1993년 ‘댄스씨어터 온’ 현대무용단을 창단하여 예술감독과 안무가 그리고 무용수로서 활동하며 발표한 작품들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이 가미된 무용 예술의 문화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정받은 그는 2010년에 창단된 국립 현대무용단 초대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어 3년간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에도 ‘빨간 부처’가 공연돼 많은 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박수갈채를 보냈던 관객 중의 한 명이었던 나는 몇 년 전 그의 인터뷰 기사로 가슴이 덜컹했던 때가 있었다.
한 기자가 ‘댄스씨어터 온’에 대한 활동에 대해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20년 가까이 순수 독립무용단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에너지가 다 방전된 느낌이다. 이제 댄스시어터 온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잠시 시간이 멈춘듯한 충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으로나 재미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단체라 힘겹게 창작작업을 해왔으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무용단은 대부분 국·시립무용단이나 대학 동문 무용단, 독립 무용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가 운영해오던 ‘댄스씨어터 온’은 순수독립 무용 단체였다.
독립예술 단체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국가지원금 예산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도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여러 예술 단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여유 있는 예산을 측정하지 못한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창작 작업을 하는 단체로써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무대를 완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현실이다.
그가 추구해온 '존재의 정체성' 주제들과 그가 보여주던 발레와 현대무용 테크닉의 바탕 위에 '기氣의 무용'으로 서구 현대무용과 차별화된 곡선적인 동작의 흐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학적인 주제를 지루하지 않게 역동적이면서 해학적 동작으로 표현해 대중성도 확보한 그의 수많은 작품은 우리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다.
또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가장 근접한 성과물이라 칭하는 ‘빨간 부처’까지 순수예술인들의 에너지가 작품에만 쏟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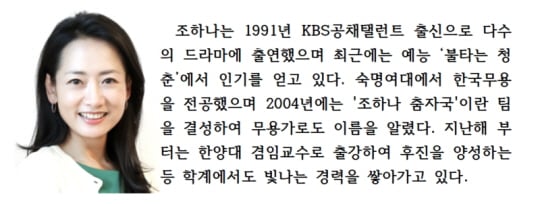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