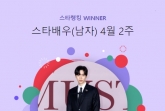|
| 고양 오리온과 서울 SK의 D-리그 경기. /사진=KBL |
KBL D-리그는 정규리그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다. 완생을 꿈꾸는 선수들이 1군 기회를 잡기 위해 활발하게 코트를 누빈다. 하지만 아직 D-리그는 가야 할 길이 멀다.
D-리그는 올 해로 출범 3회째를 맞이했다. 창원 LG와 안양 KGC를 제외한 8개 프로팀과 신협 상무 등 총 9개 팀이 참가해 4개월 동안 총 54경기를 치른다. D-리그를 통해 1군에서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신인 선수들은 프로 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다.
D-리그가 1군 무대 진입이 어려운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1군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거나 혹은 부상에서 복귀 준비를 할 때도 유용한 리그다. 현재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지만 변기훈(서울 SK)은 D-리그를 통해 슬럼프를 극복해냈다.
당시 변기훈은 "D리그가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D리그를 무시하면 안된다.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무대다"고 설명했다. 확실히 변기훈은 D-리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팀 전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D-리그가 완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LG와 KGC는 아직 D-리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LG 관계자는 "D-리그를 운영하기 보다는 1군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KBL은 "D-리그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10개 구단이 다 참가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변기훈의 사례를 봐도 못 뛰었던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D-리그를 운영하지 않는 구단을 탓할 수만은 없다. D-리그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D-리그와 1군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1군에서 긴 슬럼프를 겪었던 변기훈은 D-리그에 가자마자 50점을 몰아넣으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D-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D-리그와 같은 제도가 있을수록 농구인이 잘해야 한다. D-리그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곳에 있는 선수들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농구인에게 D-리그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고마움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과가 계속 나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