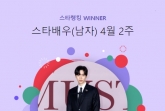|
| 강병철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사진=이기범 기자 |
강병철(68) 전 감독은 한국야구계의 원로다. 강병철 전 감독은 프로 통산 914승으로 역대 5위에 올라 있는 감독이며, 롯데 자이언츠의 딱 두 번 뿐인 한국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낸 감독이기도 하다.
더불어 '혹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감독이기도 하다. 이 혹사 논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고(故) 최동원 전 한화 2군 감독이다. 그렇다면 강병철 전 감독은 최동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강병철 전 감독은 24일 스타뉴스와 만나 최동원에 대한 기억을 공개했다.
강병철 전 감독과 최동원은 1984년 롯데의 사상 첫 우승을 합작한 인물이다. 1983년 롯데 코치로 부임한 강병철 전 감독은 이듬해 만 38세의 나이로 감독직에 올라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다.
당시 최동원은 정규리그에서 무려 284⅔이닝을 던지며 27승 13패 6세이브 223탈삼진, 평균자책점 2.40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으로 다승-탈삼진 1위에 올랐고, 한국시리즈에서는 홀로 4승을 책임지며 팀에 귀중한 우승컵을 안겼다.
강병철 전 감독이 기억하는 최동원은 말이 필요 없는 '최고'였다. 강병철 전 감독은 "최동원은 최고의 투수였다. 한국야구 역사상 많은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에서도 프로에서도 최동원은 최고의 선수였고, 최고의 투수였다. 안타까운 것은 프로에 입단했을 때 최동원이 정점에서 내려오던 시기였다는 점이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
| 현역시절 최동원.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
더불어 최동원은 페이스 조절의 달인이었다. 상대에 맞춰서 던지는 법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붙으면 이겼다.
강병철 전 감독은 "만약 상대가 해태 같은 강팀이면, 최동원은 공을 던질 때 키킹하는 것부터 달랐다. 힘차게 들어 올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정말 열심히 던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하위 팀과 붙을 때 던지는 것을 보면 '최동원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스타다.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도 팀이 역전하고 나니까 며칠 쉬었다가 나와서 던지는 것처럼 던졌다"라고 말했다.
강한 팀은 강한 팀대로, 약한 팀은 약한 팀대로 맞춰서 던졌다는 뜻이다. 팀의 에이스로서 많은 이닝을 소화해야 하고, 많은 공을 던져야 하는 최동원이 선택한 본능적인 완급조절 능력이었던 셈이다. 이는 국제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강팀과 붙을 때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강병철 전 감독은 "국제 대회 나가서 미국, 쿠바, 일본 같은 팀들을 상대로 하면 보는 사람이 '오버워크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쌩쌩하게 공을 던진다. 최동원 자신만의 방법이었다"라며 기억을 되짚었다.
더불어 최동원은 많이, 자주 던질 수 있는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최동원 하면 떠오르는 '강철'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원동력이다. 강병철 전 감독은 "최동원 하면 '연투'다. 그리고 던지면 이겼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프로에서도 최동원의 연투는 유명했다. 최동원이 암으로 세상을 등진 후 선동렬 전 KIA 감독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최동원 선배는 나에게는 없는 연투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