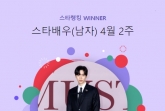|
지난 14일 막을 연 제61회 칸국제영화제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푸르른 하늘을 기대했지만 이틀 간격으로 내리는 비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미녀 군단의 모습에 가슴이 희뭇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상업적이다 아니다 말도 많은 칸영화제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의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초청하면 주인공인 안젤리나 졸리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였겠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19년만에 다시 만든 '인디아나 존스4'를 칸영화제에서 공개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르덴 형제를 비롯한 지아장커 등 거장들의 영화를 경쟁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면 칸영화제의 권위와 위상이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게 해주면 키스를 해준다거나 안아준다며 꽃단장을 하고 뤼미에르 극장 주위를 맴도는 여인들과 그녀들을 위해 표를 구하러 동분서주하는 남자들은 우리나라 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습니다.
프랑스병이라고도 하는 그네들의 느긋함이 '빨리빨리'가 익숙한 한국인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숙소까지 태워주기로 한 버스기사가 퇴근시간이 늦었다며 한밤중에 2km 앞에서 내려줄 때는 암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느긋함이 생활화됐다면 여유있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칸필름마켓의 썰렁함이었습니다. 외신들도 지적했듯이 유럽 최대 영화시장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바이어들이 잔뜩 줄었더군요. 전반적으로 파리가 날리는 가운데 그래도 한국영화들은 '놈놈놈'과 '추격자', '비몽'에 대해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어들이 준 것 외에 한가지 필름마켓에 중요한 변화도 느껴졌습니다. 다름아닌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부스들이 해변가에 주요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칸필름마켓에는 해변가를 따라 각 나라별로 천막 모양의 부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천막 위에는 각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죠. 개별 회사들은 건물 안에 위치해 있구요.
우리나라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세운 부스 위에 태극기가 나부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해변에 천막을 세울 경우 1편방미터에 4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냅니다. 그러니 한개의 천막을 세울 때 수억원이 든다는 소리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해변가에 브릭스 국가들의 부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까지 영화를 파는데 크게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이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경쟁적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이를 두고 "영화를 팔려 한다기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알리려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브릭스 국가들이 자원으로 번 돈으로 이제 문화를 알리는 데 힘을 쏟는다는 것이죠. 해마다 치솟고 있는 자릿값을 고려할 때 나중에는 돈많은 국가들만 부스를 세울 수 있는게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상이랍니다.
이쯤에서 한국영화계를 뒤돌아봤습니다. 요 몇년간 한국영화계의 화두는 위기였죠. 거품을 빼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언론의 기사를 참조해 외신들도 한국영화계가 위기라는 기사를 쏟아냈었죠.
이번 칸필름마켓 소식지에도 한국영화가 위기라며 두 페이지를 할애했더군요.
경제가 위기가 위기다 하면 소비가 위축돼 더욱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화도 위기가 위기다 하면 더욱 위축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을...우리가 브릭스 국가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위기라고 하면서도 매년 꾸준히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매년 그런 성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한국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좋은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칸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추격자'와 비경쟁부문에 스티븐 스필버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놈놈놈'이 바로 좋은 예죠.
마침 칸국제영화제 기간에 발행되는 데일리에 부산국제영화제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된데에는 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애정어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에 애정을 가져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늦은 밤 칸에서 편지를 올립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