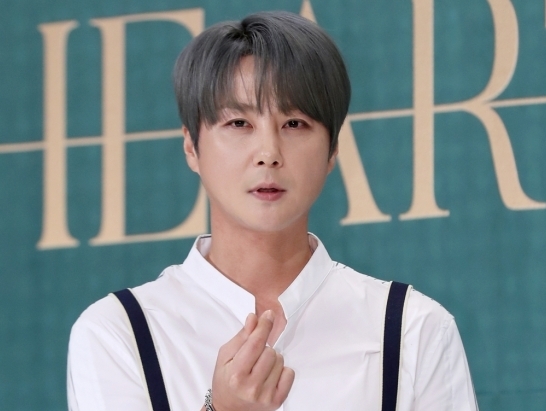|
봉준호가 돌아왔다. '괴물'로 한국영화사를 다시 쓴 그가 1년 여의 침묵 끝에 옴니버스 영화 '도쿄'로 관객을 만난다.
사실 '도쿄'는 엄밀히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도쿄를 소재로 한 이 영화에 레오 까락스, 미셸 공드리와 함께 일부를 담당했을 뿐이다. 하지만 특유의 섬세함은 30분짜리 단편에도 변함 없었다.
'흔들리는 도쿄'라는 단편에 봉준호 감독은 11년째 방안에서 살고 있는 히키코모리(은둔형 폐인)를 주인공 삼아 갇힌 공간에서의 탈출을 그렸다. 문틈으로 떨어지는 빛에, 방 안 빼곡히 차 있는 휴지, 그리고 텅 빈 거리.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싫어하는 그지만 여전히 피자상자 하나에도 의미를 담았다.
15일 '도쿄' 시사회가 끝난 뒤 봉준호 감독을 만났다. '마더' 촬영에 쫓겨 비행장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예의 유장한 달변은 여전했다.
-세 편의 단편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은.
▶레오 까락스의 '광인'이다. '폴라엑스' 이후 레오 까락스 감독이 9년만에 복귀하는 게 아닌가. '나쁜 피'를 고교 시절 봤는데 그 때부터 팬이었다. 오랜만의 복귀인데다 그의 페르소나인 드니 라방과 함께 작품을 찍는다니 엄청나게 기대했다. 특히 지난 칸국제영화제에서 봤을 때 온 세상을 향해 복수를 하는 듯한 그의 모습이란. 레오 까락스와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초현실 같은 느낌이었다.
-도쿄의 이미지를 히키코모리에서 찾은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상당히 진부하게 도쿄하면 지진이 떠올랐다. 그러다 얼마 안가 그 생각을 접었다. 물론 지진은 이 영화에 소재 중 하나로 쓰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먼저 솔직하게 내게 질문을 했다. 도쿄를 갈 때마다 무엇을 느꼈는지. 사람들이 외로워 보이더라. 어느 대도시나 사람들은 외롭기 마련이지만 도쿄에서는 묘하게 위축된 모습을 많이 봤다. 만원 지하철에서도 서로 닿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히키코모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원래 극단적인 상황을 좋아하니깐.
-감독이라는 직업에서도 히키코모리의 정서가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직접 쓰니깐 그 때는 제일 외롭고 힘들다.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를 찍을 때였다. 영화사의 강요(?)로 속초에 있는 펜션에 보내져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다. '처녀들의 저녁식사'도 그곳에서 써서 잘 나왔다며.
두 달간 한 줄도 못쓰고, 파도 숫자만 셌다. 나중에는 나를 상처준 사람 리스트를 적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떠올렸다. 지금은 커피숍을 전전하며 시나리오를 쓰지만 그 순간이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에서의 작업은 어땠는지.
▶특별히 앞으로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니 미리 연습해보자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호기심이랄까, 스스로를 객지에 던져놓고 싶은 자학적인 심정이 있었다. 한국 스태프와 갈 수 있었지만 일본 스태프와 신인 감독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겪다 보니 한국 스태프와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더라. 전 세계 어디서나 영화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다. 일본 스태프는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하면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아오이 유우를 히키코모리가 사랑하는 상대로 캐스팅한 까닭은.
▶이번 영화는 캐스팅이 순서대로 이뤄졌다. 먼저 '유레루'를 보고 동작으로 훌륭하게 연기를 한 카가와 테루유키가 히키코모리에 딱이라고 생각해 그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썼다. 그리고 그런 히키코모리를 한방에 사랑에 빠지게 할 만한 배우는 아오이 유우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 엉뚱한 피자집 주인에는 역시 '으라차차 스모부'에 나오는 다케나카 나오토 밖에 없더라. 일본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을 캐스팅할 수 있게 된 것이 행운이고 기뻤다.
-아오이 유우와의 작업은 어땠는지.
▶'훌라걸스'를 봐도 알겠지만 아오이 유우는 묘한 매력이 있다. 실제로 볼 때도 묘했다. 요정 같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느낌이었다. 평범한 지방도시 아가씨 같은데 카메라 앞에 서면 순식간에 장악을 하더라. 천상 배우구나라고 생각했다.
-아오이 유우의 몸에 각종 버튼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게 인상적이던데.
▶역시 주인공이 히키코모리라는 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이다. 남과 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자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아오이 유우를 타투 아티스트를 꿈꾸지만 비루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여인으로 설정했다. 자신의 몸에 버튼 문신을 새긴 것도 그 때문이고. 아오이 유우가 카터벨트를 한 것 또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 주인공이 다리를 보고 놀라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2007년에 오사카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실제로 그런 복장을 한 여성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때 각인된 인상에서 출발했다.
-봉준호 감독 영화 중 처음으로 멜로에 도전했다고 소개됐는데.
▶멜로영화라고 깃발을 세우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히키코모리가 가장 불가능한 게 누군가와의 접촉이고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살인의 추억'도 스릴러라는 깃발을 세우고 찍은 것은 아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군가가 '흔들리는 도쿄'를 멜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하지만 장르에 대한 강박은 없었다.
-'흔들리는 도쿄'에도 전작처럼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던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집에서 뛰쳐나와 만져라,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영화에도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봉테일이라는 별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웃음) 디테일에 집착하는 변태 악마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 치밀함은 좋지만 그런 잣대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좁은 공간에 사람 하나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찍어야 했다. 그래서 희한한 소품까지 준비했고, 특히 빛에 많은 신경을 썼다. 보는 관객이 피부에 빛이 닿는 것처럼 묘사하고 싶었다.
-로봇이 등장하던데.
▶와세다 대학 공학부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쓰러지면 몇 천만엔이 날아가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잔뜩 긴장했다. 제법 일본에서 대접을 받았다.(웃음)
-'유레루'에 출연한 카가와 테루유키와 작업을 했다. 역시 '유레루'에 출연한 오다기리 죠는 김기덕 감독과 작업을 했는데.
▶묘한 인연이다. 김기덕 감독 영화의 광팬이다. DVD를 다 가지고 있다.
-3년만에 단편을 찍었는데.
▶디지털 3인3색으로 단편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드라마보다는 영상에 치중했다. 이번에는 30분짜리지만 드라마가 굴곡이 있다. 이 정도 드라마 밀도가 영화 찍을 때 가장 편하게 느껴진다.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감독도 있지만 나는 이 정도 스케일이 좋다. '흔들리는 도쿄'는 가깝지만 먼 곳에서 공들여 찍은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