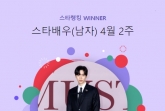|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 극장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며 제2의 '도가니'처럼 인식되고 있다.
3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30일 9만 9722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97만 4049명을 동원했다. '부러진 화살'은 평일에도 5만명 이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31일 200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부러진 화살'은 실화인 석궁테러사건을 소재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으로 비화했다.
이런 점에서 '부러진 화살'은 일찌감치 '도가니'로 비견됐다. 지난해 9월 개봉한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직원들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영화는 500만 관객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인화학교 폐지 등 실질적인 움직임까지 일었다.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는 실화를 다뤘다는 점과 사회 부조리를 응시했다는 점, 또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됐다는 점에서 닮은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두 영화는 닮은 듯 다르다.
'도가니'는 가해자를 명확한 악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부러진 화살'은 김 교수를 정의로 그리지도 않았으며, 법원의 절차 문제점, 그리고 오만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부러진 화살'에 공감하는 건 법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으면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불어터진 화살'이 날라 와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 영화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다르다.
'도가니'가 개봉했을 때는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재보궐 선거를 앞둔 때였다. 영화 내용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악인이 명확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선명성 경쟁을 하듯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정치권이 생색을 내기 쉬운 사안이었다. 생색내기 힘든 여야 의견이 갈린 사학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법원과 쟁점이 된 듯하지만 논쟁의 배경엔 좌우 문제가 깔려있다. 당시 석궁사건 피해자였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았던 것이 알려지며 '나꼼수' 팬들 사이에서 성토의 대상이 된 게 일례다.
정지영 감독이 '나꼼수' 일원인 정봉주 전 의원 석방 1인 시위에 나서고 영화 내용에 BBK 사건을 다룬 신문이 소개되는가 하면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것도 반대쪽에선 영화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요소다.
당시 김 교수를 변호한 박훈 변호사가 4.11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것도 '부러진 화살' 논쟁이 정치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인데다 법원을 겨냥한 영화다보니 정치권도 상대적으로 잠잠하긴 하다. 여론이 '부러진 화살'을 두둔하고 있어 법원편을 쉽게 들진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 역풍이 불수도 있다.
트위터상에 "문성근 최고위원이 '부러진 화살' 러닝개런티를 받아 선거에 쓰면 좋겠다"는 글들이 나도는 건 위험신호다.
영화는 영화다. 감독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든 영화는 허구의 산물이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를 어떻게 보든 관객의 몫이라 생각했지만 워낙 말들이 많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 해도 영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기 때문인 것 같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인
라인
 웨이보
웨이보